OECD 38개국 평균 상속세 최고 세율은 27.1% 한국은 50%
최대 주주에 대한 징벌적 할증 부과 없애야 진정성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현안 이슈로 제기하면서도 왜 상속세 개편을 들고 나선 건지 대중은 헷갈리는 듯하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감성적으로 말한 건 사안의 본질이 무언지 더욱 알 수 없게 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이어도 10억원 정도 공제액을 가지고는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현실에 맞춰 기본·배우자공제 금액을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올리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보면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이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경영권 유지가 힘겨워지고, 그로 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율 인하를 추진해 온 것은 그래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이를 반대한다. 이 대표는 상속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그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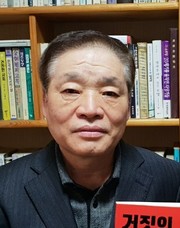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 세율은 27.1%다. 한국은 50%로 두 번째로 높다. 문제는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주식평가액을 20% 할증한 뒤 상속세율을 적용함으로써 60%로 높아져 세계 최고의 세율이 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최대 주주에게 징벌적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의 대물림을 막자는 취지일 텐데 이 취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라면, 그리하여 우리 경제에 독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사코 이에 반대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부의 대물림이 나쁘냐는 것이다. 부의 대물림은 불공정한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 A는 아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대신 외국 유학까지 보내 능력을 키우는 데 투자했다. 그의 아들은 박사학위도 따고, 전도양양한 글로벌 IT 기업의 핵심 연구자로 고소득을 올리며 이력을 쌓다가 기업을 일으켜 성공했다. 반면 B는 재산을 아들 공부시키는 데 쓰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빌딩을 상속으로 남겼다. A의 아들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B의 아들은 상속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국가에 빼앗겼다. B가 기업을 물려주었다면 60%까지 빼앗겼을 것이다. 이건 공정한가.
부의 대물림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 내가 부지런히 일해 재산을 모아도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면 사람들은 애써 재산을 축적하려는 의욕을 잃을 수 있다. 어쩌면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도 없어질지 모른다. 먹고 살 만할 정도로만 일하고 그 이상 재산을 모으려 할 유인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할 자산이 축적되지 않게 되어 경제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듯 부의 대물림 문제는 하나의 잣대로만 잴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부의 대물림이 부당하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민주당은 대기업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고율의 상속세는 중소기업에도 치명적이다. 물론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공제 조건이 엄격해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은 연평균 80여 곳에 그친다. 유사한 방식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의 연간 1만 3000곳의 1%도 채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 과정에서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회사를 접거나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와 연구원의 이야기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는 자원, 곧 부(富)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주체들(국민·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세수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높은 상속세가 기업이 다음 세대로 승계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렇거니와 과학적 연구 결과도 상속세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율 인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특히 최대 주주에 대한 징벌적 할증 부과는 없애야 한다. 이게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이며, 이것이 빠지면 상속세 논의는 하나 마나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잘사니즘’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